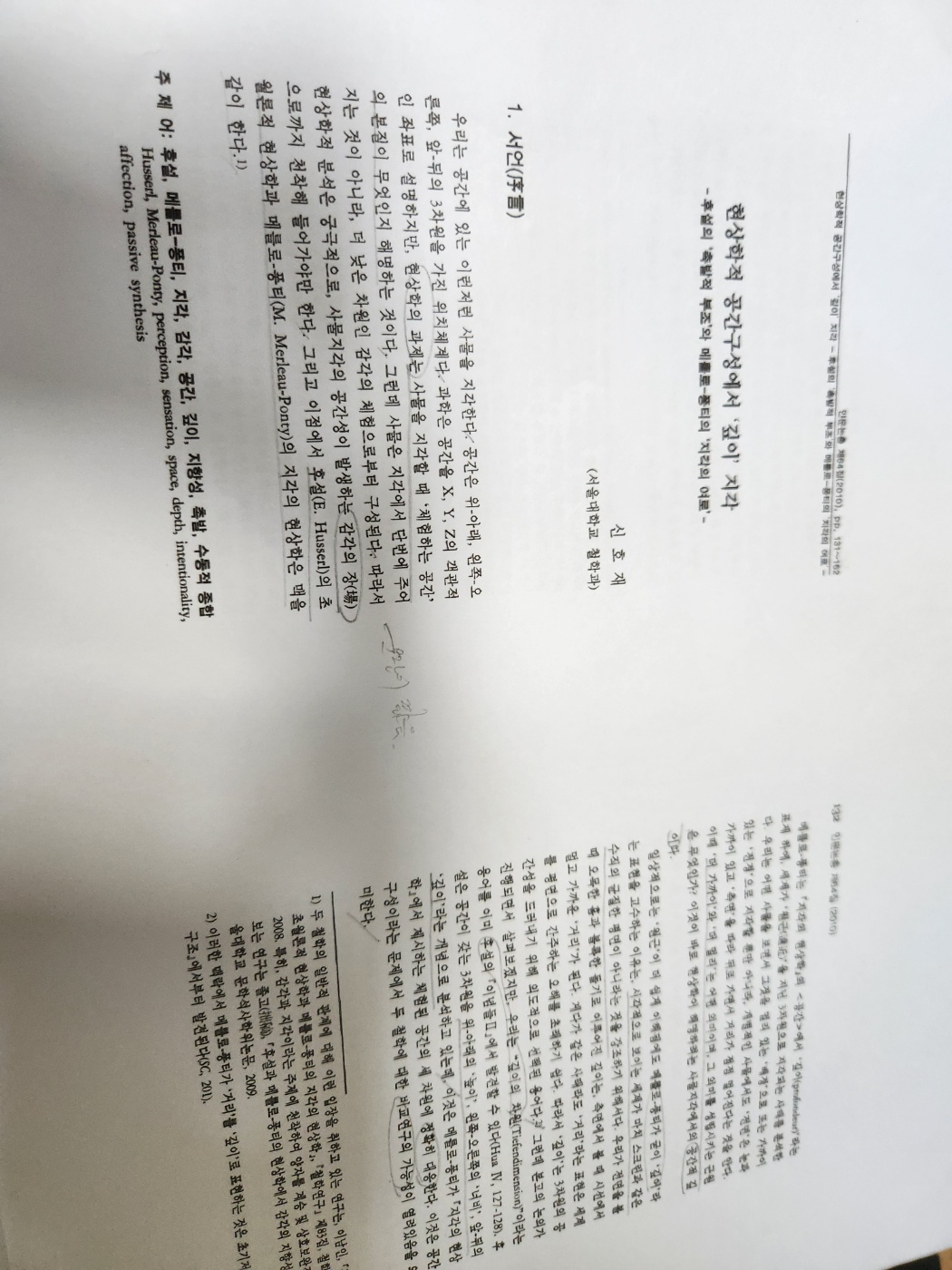무지한 참주의 무지에 관한 플라톤과 에픽테토스의 입장 분석 및 비판 본고의 목적은 『고르기아스』 466b-470c와 『강의』 1권 19장에 언급되는 참주에 대한 플라톤과 에픽테토스의 입장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한 후 평가하는 것이다. 여기서 참주는 죽이고 싶은 자는 누구라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이다. 참주라고 해서 꼭 무지(無知)할 필요는 없지만, 플라톤과 에픽테토스가 논의하는 참주는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의 분별없는 행사에 도취된 자이다. 본고는 이러한 무지한 참주의 무지를 두 철학자가 각각 어떻게 이해했는지 분석한 후, 둘 사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, 차이점을 토대로 둘을 짧게 비판한다. 1. 『고르기아스』 466b-470c : 정당함과 부당함에 관한 무지 플라톤에 따르면, 어떤 ..